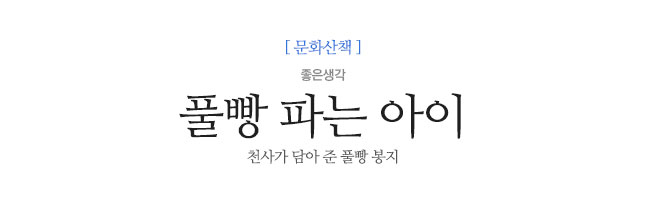올봄이다.
꽃샘추위에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는 날, 지하철역 입구에서 피어오르는 풀빵 냄새가 출출한 내 발걸음을 잡았다.
작은 천막 속에 후덕한 미소를 지닌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다.
“풀빵, 천 원어치 몇 갭니까?”
“네 개예요.”
천막 구석에서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.
딸로 보이는 아이가 엄마를 돕겠다고 나온 듯했다.
무슨 재미난 얘기를 나누는지 두 사람 표정이 거리의 불빛보다 밝았다.
추운 날씨도, 사람들의 시선도 모녀의 소박한 행복을 중단시키지는 못하나 보다.
“이천 원어치 주세요.”
이상했다.
얼핏 보아도 아주머니의 풀빵 다루는 솜씨가 서툴렀다.
시각 장애인이었다.
내 시선은 초등학교 4~5학년쯤으로 보이는 아이에게 머물렀다.
눈망울이 어찌 그리 맑을까.
이 작은 사람들이 버티기에 세상은 너무 험난했을까.
어둡고 무서운 세상을 차마 볼 수 없어 닫혀 버린 엄마의 눈 대신에, 신(神)은 이 아이에게 천사의 눈을 주셨나 보다.
작은 쇠꼬챙이를 든 아이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.
고사리 같은 손이 풀빵 탁자 위를 춤추듯 지나가면, 노릇노릇 익은 풀빵이 순식간에 뒤집혔다.
순간, 봄바람에 꽃망울이 터지듯 온기를 머금은 풀빵이 고소한 향내를 퍼뜨렸다.
아이는 무엇인가를 다짐한 듯 입을 꾹 다물었다.
익은 풀빵이 제 손에 뒤집히듯 지금의 팍팍한 현실이 언젠가 해 뜰 인생으로 뒤집힐 날을 꿈꾸는 걸까.
계산하기 위해 지갑을 여니 삼천 원이 있었다. 다 빼서 아이에게 건넸다.
“어? 아저씨, 풀빵은 이천 원인데요.”
“응, 그냥……. 천 원이 더 있길래.”
아이는 의아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.
엄마가 아이에게 말했다.
“참 고마우신 분이네.”
쑥스러워 후다닥 뒤돌아 나왔다.
귓불이 붉어졌다.
‘고맙다니, 겨우 천 원 더 줬을 뿐인데.’
저 천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에 가당찮은 일인가.
식을까 봐 봉지를 외투 속에 품으니 코끝이 찡해 왔다.
천사가 담아 준 풀빵 봉지가 식어 버린 내 가슴을 따뜻하게 지폈다.